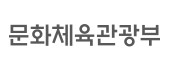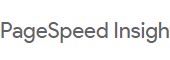-
이름 모를 소녀?
안개 속에 사라져간 이름 모를 소녀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조그만 연못가에,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버들잎을 하나하나 따서 연못 위에 띄워놓았다. 잎들은 가볍게 물결 위를 떠다니며, 연못을 장식했다. 소녀는 그 잎들이 물결에 출렁이는 모습을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산새들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고요한 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작은 연못은 소녀만의 피난처였다. 달빛이 연못에 비추어 금빛 물결을 만들었고, 그 물결은 바람에 의해 살짝 출렁였다.
소녀는 그 출렁이는 물결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 했다. 그녀는 물결이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가져가 줄 것만 같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말은 없었다. 그저 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던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녀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났다.
밤은 계속 깊어갔고, 산새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작은 연못은 다시 한번 조용함으로 돌아갔다. 달빛에 젖은 금빛 물결은 바람에 의해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 사라진 이름 모를 소녀의 존재는, 연못가의 고요한 밤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그 후로도 매일 밤, 그 연못은 고요함을 유지했다. 마치 그 소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연못의 물결은 매일 밤 달빛에 의해 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녀가 띄운 듯한 버들잎들이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산새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는 듯 조용히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연못가는 다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매우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또 다른 방랑자가 그 연못을 발견했다. 그는 연못가에서 버들잎이 물결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 장소에 앉아,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독을 상상하며, 잠시 동안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방랑자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둘러싼 고요함과 평화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느꼈을 감정들을 이해하고, 그녀의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의 존재가 이 연못과 함께 계속 살아있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가고, 방랑자는 마침내 그 장소를 떠났다. 그는 연못가에서 느낀 평화로움과 그 소녀에 대한 생각을 가슴 속 깊이 간직했다. 그 소녀와 그 연못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연못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밤마다 달빛에 젖은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며, 이야기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펼쳐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 작은 연못은 산속의 숨겨진 보석처럼 고요하게 자리를 지켰다. 버들잎이 출렁이는 물결과 달빛 아래 금빛으로 빛나는 연못은, 이름 모를 소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연못과 그 주변의 자연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평온함과 깊은 사색의 순간을 선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녀에 대한 기억은 전설처럼 변해갔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연못을 찾는 이들 사이에서 속삭임으로 전해졌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연못가에 남아,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를 제공했다.
그 연못은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곳은 사색과 치유를 찾는 이들에게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달빛 아래 출렁이는 금빛 물결은 그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었고, 소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하여, 이름 모를 소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못가의 고요함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위안과 평화를 선사했다. 그 작은 연못은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를 품고, 매일 밤 달빛에 젖은 금빛 물결을 만들어내며, 고요하게 그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뉴스8080 구독 후원 하기
- 신한은행 140-008-268397 (주)신화8080
계좌번호 복사하기
 위로
위로